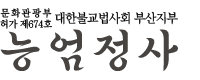불(佛)알. 공(空)알, 빌어먹을 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관련링크
본문
불(佛)알. 공(空)알, 빌어먹을 놈!
우리나라 한의학에는 사상의학이라는 것이 있다.
체질을 감정하여 처방을 하는 방법인데 조선시대 동의보감을 저술한 명의(名醫) 허준 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동의 이제마 선생이 창안한
의술인데 신묘한 효력을 발생하는 독특한 의술이다.
요즘은 우리 국민들의 체질이 서양화가 되어서 체형을 보고는
사상체질 감별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한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오운(五運)육기(六氣)라는 방법이다.
태어난 계절을 보고 체질을 감정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봄=소양인(少陽人), 여름=태양인(太陽人), 가을=소음인(少陰人), 겨울=태음인(太陰人)으로 보는 방법이다.
대체로 이런 방법으로 분류를 하는데 좀 더 정확히 보는 방법은
전문성을 요(要)한다.
그러나 이 방법을 적용하기도 신통찮다는 반응도 있다.
요즘은 제왕절개(帝王切開)로 출생하는 사람들이 많아 입태일(入胎日)과 출생일(出生日)에 대한 정의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혈액형(血液型)으로 체질을 감정하는 방법이다.
A형=태음인(太陰人), B형=소음인(少陰人), O형=소양인(少陽人)
AB형=태양인(太陽人)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도 좀 더 정확히 보려고 하면 맥진(脈診)을 보는 등
전문적인 진료를 필요로 한다.
이 방법에도 별 신통찮은 반응을 보이는 전문가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액형을 통(通)한 성격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혈액형은 유전되기 때문이란다. 혈액형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때 혈액형에 대한 재미있는 비유(比喩)방법이 등장했다.
A형: 소세지=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은 성격.
B형: 오이지=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성격.
O형: 단무지=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성격.
AB형: 쓰리지=이러지 말고 저러지도 말라는 지랄 같은 성격이라고
표현한다. 딱 맞는 말은 아니라도 비교적 이해가 된다는 반응들이다.
오늘 내가 이 글에서 논(論)하고자하는 내용은 사상체질이 아니다.
그렇다고 혈액형을 논(論)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무슨 놈의 법사(法師)가 그런 시시한 일에 관심을 보이겠는가?
적어도 부처님 불법(佛法)에 관심을 보이고 논(論)해야 되는 것이다.
앞에서 혈액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지랄(智樂)은 원래 불교용어(用語)이다.
지락은 발음(發音)이 어색하여 지락이 지랄로 변화된 것이다.
지(智)랄(樂) = 알고 깨달아서 즐겁다는 불교에서 쓰는 용어(用語)란다.
‘지랄(智樂)용천(湧泉)을 한다.’ 는 말이 있다.
노자(老子)는 도덕경(道德經)에서 범부(凡夫)는 가슴으로 숨을 쉬고
도인(道人)은 발끝으로 숨을 쉰다고 한다.
발바닥에는 용천혈(湧泉穴)이 있다.
용천혈은 다른 이름으로는 사활(死活)혈(穴)이라고도 할 정도로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신묘한 혈(穴)자리이다.
신장(腎臟)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혈(穴)자리로 사람의 정력(精力)을 관리하는 중요한 혈(穴)자리이다.
참선(參禪)을 하는 스님들이나 복식호흡을 하는 수행인들은 아랫배의
단전(丹田)으로 숨을 쉰다.
그러나 좀 더 수련(修鍊)이 된 수행인들은 단전(丹田) 아래 발바닥에 위치한 용천혈(湧泉穴)로 숨을 쉬는 것이다.
용천혈로 숨을 쉴 수 있는 경지를 지락(至樂)이라고 한다.
이는 수행을 통하여 즐거움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락(至樂) 또는 지락(智樂)용천을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설쳐대는 지랄용천(?)이라고 알고 있다.
‘미친놈 지랄용천을 다한다.’ 는 욕설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말 중에 ‘빌어먹을 놈’이라는 욕설이 있다.
남 잘되라고 빌어주고 먹고사는 사람을 낮추어 하는 욕설이다.
빌어주고 먹고 사는 사람은 옛날 탁발하는 스님을 두고 하는 욕설이다.
‘혀가 만발이나 빠질 놈’ 이라는 욕설도 있다.
혀가 만발이나 되는 사람은 화엄경에 등장하는 부처님 밖에 없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이 경전을 설하실 때 혀가 동방으로 팔만사천
나유타 겁의 거리를 뻗어나갔다는 설명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우리 속담에 혀가 긴 사람은 거짓말을 잘한다고 표현한다.
그래서 혀가 코끝에 닿으면 거짓말쟁이라고 한다.
이 말은 혀가 긴 부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욕설에 ‘오도 방정을 다 떤다.’라는 말도 있다.
불교의 오온(五蘊)에서 나온 욕설이다.
‘병신 육갑떨고 있네!’는 절간에서 신도들의 길흉을 점치느라고 육갑을
짚고 있는 스님들을 욕하는 말이다.
이것은 육바라밀 등을 빗대어 하는 욕설이다.
‘칠칠(七七)맞다.’ 는 비속어(卑俗語)도 있다.
불교의 칠각(七覺)지나 칠성(七星)신앙 등을 빗대어 하는 욕설이다.
‘팔푼이’라는 비속어도 있다. 물론 팔정도등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대표적인 욕설이 십(十)이다. 얼마나 진한 욕설인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이라는 숫자를 열(十)로 읽기도 한다.
불교의 10선업(十善業)등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하루에 열두 번도 더 변한다.’라는 비속어도 있다.
12연기(緣起), 12처(處)등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십팔이라는 욕설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욕설이다.
불교의 18계(界) 등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36계(界) 줄행랑 이라는 비속어도 불교를 빗대어 하는 비속어이다.
불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숫자는 모두가 다 욕설이 되었거나
비속어(卑俗語)로 만들어 놓았다.
불교 용어(用語) 중에 용심(用心)이라는 단어가 있다.
중생들은 사주팔자 관상(觀相)등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손바닥에 생긴 금으로 운명을 점치는 것을 수상(手相)이라고 한다.
수상(手相)이 아무리 좋아도 얼굴(얼꼴) 생김새 모습으로 점치는 관상(觀相) 보다는 못하다고 한다.
또 관상(觀相)이 아무리 좋아도 배(腹)의 생긴 모양으로 점치는 복상(腹相) 보다는 못하다고 한다.
복상(腹相)이 아무리 좋아도 등(背)의 생긴 모양으로 점치는 배상(背相)보다는 못하다고 한다.
복상(腹相)과 배상(背相)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의 씀씀이 심상(心相)보다는 못하다고 한다.
마음의 씀씀이는 복상과 배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배의 생김새인 복상은 중생의 탐심(貪心)을 나타내는 상(相)이다.
복상(腹相)을 복상(福相)이라고도 한다.
원하는 바 탐심이 다 이루어지면 복(福)이 많다고 하는 것이다.
등의 생김새인 배상은 중생의 진심(嗔心)을 나타내는 상(相)이다.
‘서로 등 돌렸다.’, ‘서로가 등졌다.’ 등의 표현은 서로간의 진심에서 발생되는 갈등으로 인해 소원해지는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복부(腹部)의 모습에서 식탐(食貪)을 비롯한 탐심을 알아내고
어깨가 축 쳐지고, 살짝 올라가고 하는 등(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사기(士氣)를 비롯한 기운상태를 점쳐 알아내는 것이다.
이처럼 복상(腹相)과 배상(背相)은 중생의 마음 씀씀이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참 모습인 심상(心相)인 것이다.
심상은 마음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얼굴로 나타내게 되는데 얼굴의 어원(語源)은 얼(혼(魂:마음)의 모습(꼴), 얼꼴이다.
이 심상(心相)을 불교에서는 용심(用心)이라고 한다.
청정(淸淨)하고 정정(正正)한 바른 마음을 닦는 것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닦는다’고 표현하는데 마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표현은 ‘마음을 쓴다.’는 말이 맞는 것이다. 용심이 맞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용심이 곧 수행인 것이다. 용심이 곧 불교인 것이다.
그런데 이 용심이 엉뚱하게도 심술을 부려 남을 해치는 마음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몹시 심술을 부리고 남의 일을 사사건건 트집 잡고
훼방하는 사람을 용심꾸러기 또는 용심장이라고 한다.
이 말은 마음 닦는(쓰는) 수행공부를 하는 불교인들 모두를 빗대어
멸시하는 조선조 사대부들의 비뚤어진 용심이 숨어있는 것이다.
한국의 욕설 중에 표현하기가 좀 거북한 욕설이 ‘불알과 공알’이다.
불(佛)알과 공(空)알은 원래는 불교용어이다.
600반야(般若)부 경전을 대변하는 금강경(金剛經)에는 중생(衆生)의
출생방법을 약난생(若卵生), 약태생(若胎生), 약습생(若濕生), 약화생(若化生)의 사생(四生)으로 나타내고 있다.
알(卵)로서 태어나는 중생, 태(胎)로서 태어나는 중생,
습기(濕氣)로 태어나는 중생, 변화하여 태어나는 중생,
이렇게 네 가지 출생방법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생(四生)을 각각의 출생방법으로 보면 안 된다.
인간의 일생(一生)은 이 사생(四生)을 다 거쳐 가는 것이다.
사람이 아버지 몸 속에 있을 때 머물고 있는 곳을 불(佛)알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하여 모든 중생은 모두가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설(說)하셨다.
태어나 중생의 업보(業報)를 받기 이전의 인간은 모두 부처인 것이다.
부처 씨앗이 들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불(佛)알인 것이다.
공(空)알은 비어있는 알(卵)이라는 뜻으로 여성의 난자(卵子)를 뜻한다.
아버지 불(佛)알을 출발한 인간이 어머니의 공(空)알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전생의 업(業)에 맞는 업보(業報)를 만나 태어나는 것이다.
아버지 불(佛)알(卵)속에 들어 있을 때가 바로 약난생(若卵生)이다.
아버지 몸에서 어머니 몸으로 옮겨가면 물(水)로 옮겨가게 된다.
어머니 태(胎)속에서도 물 속(양수)에서 성장하고 평생(平生)을
70%정도 물로 구성된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이 약습생(若濕生)이다.
어머니 공(空)알(卵)속에 들어가 태어날 때 까지가 약태생(若胎生)이다.
인간은 태어나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수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변화를 약화생(若化生)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因緣)의 시발점이자 부처님께서 설하신 부처와 중생의 출발점인 불(佛)알과 공(空)알이 차마 입으로는
표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욕설로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다 불교를 의도적으로 훼불하고 폄하하는 욕설인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우리들의 생활주변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비유어(譬喩語)중에 ‘아수라장(阿修羅場)’이라는 낱말이 있다.
이 또한 불교를 욕보이고자 의도적으로 꾸며 쓰는 말이다.
아수라장은 중생의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의 육도윤회에
등장하는 아수라(阿修羅)를 빗대어 만들어낸 비속어이다.
아수라는 인간보다 한 단계 높은 신(神)의 경지(境地)를 말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보다 한 단계 높은 신(神)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를 뜻하는 비속어가 된 것이다.
그 말속에는 신(神)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이를진대 신(神)보다 한 단계
아래인 인간세계 불자(佛子)들의 신앙(信仰)과 삶을 혼돈(混沌)과
난장판으로 몰아가고 비꼬아 이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 있다. ‘이판(理判)사판(事判)’이라는 비속어도 있다.
원래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은 수행하는 수행스님과 수행스님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뒷바라지해주는 절 살림을 사는 스님들을
뜻하는 말이다. 요즘은 이판을 수행승(修行僧), 사판을 행정승(行政僧)이라고 고쳐 부른다.
스님들을 뜻하는 성스로운 말이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死生決斷)을
내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뜻하는 비속어로 바뀐 것이다.
또 있다. 야단법석(野壇法席)이란 비속어도 있다.
야단법석(野壇法席)은 원래 불교 용어다. 부처님(BC 563~483)께서
가시는 곳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려는 중생들이 인산인해처럼
모여들어 자주 설법의 자리를 야외(野外)에 마련해야 했다.
그래서 야단(野壇)은 야외에 세운 단(壇)이고 법석(法席)은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이다.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화경(法華經)을 설법(說法)했을 때는
무려 300만 명이 모였다는 설도 있다.
이 야단법석(野壇法席)이 야단(惹흩트러지다, 엉겨 붙다.端)법석(法席)으로 둔갑(遁甲) 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說)하시는 청정(淸淨)하고 성스로운 야단법석(野壇法席)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끄럽고 어수선한 난장판 야단법석(惹端法席)으로 변화된 것이다.
최근 기독교 계통의 어느 신문사 일간지(日刊紙)에서 야단법석을
인용(引用)한 아래와 같은 기사를 읽은 적 있다.
「..............그런데 잘 알려진 이 야단법석의 유래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야단을 야단(惹端)으로 보는 견해, 즉 야기사단(惹起事端)의 준말로 보는 견해다. 이 말의 유래는 원래 고승의 설법을 듣는 자리, 즉 법석은 엄숙해야 하는데도 ‘무슨 괴이한 일의 단서가 야기되어 매우 소란한 형국이 됐다’는 데서 비롯됐다고 한다.
화두(話頭) 풀이가 잘 납득이 안 갔는지? 회중끼리 충돌이 있었는지? 는 모르지만 말이다. 하여튼 이 말에서부터 ‘큰소리로 꾸짖는다.’는
야단이 나왔고, ‘생트집을 잡는다.’는 야료도 나왔다고 한다...........」
신문지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불교계를 흠집 내고 부처님을 비롯한 큰 스님들을 헐뜯는 무서운 음모가 숨어있는 기사이다.
이들이 호시탐탐 불교계를 흠집 내며 허물을 들추고 파고들 때에
과연 불교계는 무었을 하고 있었는가?
아마도 불교계는 출가(出家)불교에서는 출가 불교의 본분(本分)에
어울리지 않게 감투싸움에, 권력싸움에 연연하고 재가(在家)불교 역시
이 싸움에 휩쓸려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절 큰 스님이 이번에 ○○종 중앙 종회 위원이 되셨다!
“우리 절 큰 스님이 ○○종 무슨 부장이 되셨다!
“우리 절 큰 스님이 ○○종 ○○원장이 되셨다!
보살님들은 모이면 자기 절 큰 스님 감투자랑이 대단하다.
마치 자기가 벼슬을 한 양 떠들고 설쳐대는 참으로 한심한 현실이다.
옛날 우리 진짜 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