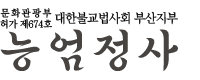보살의길 세속의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관련링크
본문
보살의 길 세속의 길
오랜만에 옛날 새마을 동지 김 회장님이 방문했다.
어디서 곡차를 조금하셨는지 언행이 조금 어수선해 보인다.
하긴 술기운을 안 빌리면 찾지도 못할 분이다.
반가움에 합장하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나에게 대뜸
“회장님 괴로워 죽게 습니다. 술 한 잔 사주이소.
참 그 옛날에는 어울려 소주도 많이 마셔든 동지인데 나는
“아이고 김 회장님 약주 좀 하셨건만, 들어오십시오.
맛있는 차 한 잔 대접할게요,
차실로 안내해도 막무가내로 소주한잔을 요구한다.
몹시도 괴로운 일이 있는가 보다.
지난 토요일 영도 보살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느닷없이
“법사님 축하합니다. 한턱내세요. 한다. 영문을 몰라
“뭘요?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법사님 남자 외손자 보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거듭 축하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온다.
사실 나는 그날 괴로워하는 옛 동지 김 회장님을 흡족하게 해드리지도 못했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영도보살님께 한턱도 대접하지 못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삶의 질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날 술집에서 음료수만 마셔대는 나를 보고 김 회장님은
“회장님 참 많이 변했네요? 재미없어 가렵니다.
는 말과 함께 서운해 하며 자리를 뜨고 말았다.
그렇다 나는 능엄정사를 지키고 가꾸면서 불자(佛子)다운 불자가
되기 위하여 피나는 수행을 해 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불자로서의 삶과 세속인으로서의 삶은 큰 차이를 보인다.
*, 좋은 일이 있으면 세속인들은 축하와 더불어 한턱 쏘고 본다.
분에 넘치는 더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크게 잔치를 벌인다.
불자(佛子)는 좋은 일이 있으면 우선 부처님과 주위인연에 감사부터 드린다. 분에 넘치는 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와 더불어 회향한다.
*, 힘들고 화나는 일이 생기면 세속인들은 흥분하고 화부터 먼저내고 소주를 마셔댄다.
보살(菩薩)은 힘들고 화나는 일이 생기면 인욕(忍辱)하고 기도를 한다.
*, 미칠 정도로 괴로울 때는 세속인들은 어떻게 할까?
미처 발광하며 거리로 뛰쳐나가 뭔가를 주절주절 거리며 방황한다.
아니면 우울해 하며 방구석에 쳐 박혀서 두문불출하며 말문을 막는다.
발광(發狂)으로 미치고. 우울(憂鬱)해서 미친것이다.
보살(菩薩)이라면 어떻게 할까?
보살(菩薩)은 법당을 찾아들어 신묘장구대다라니 나 반야심경,
광명진언을 주절거린다. 아니면 결가부좌하고 앉아 조용히 침묵한다.
주력(呪力)기도나 참선(參禪)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 환장(換腸)할 정도로 괴로울 때는 세속인들은 어떻게 할까?
참지 못하고 환장(換腸)하여 사건(事件)사고(事故)를 저지른다.
남의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민족을 배신하고,
심하면 부모 형제도 죽인다.
보살(菩薩)이라면 어떻게 할까?
보살(菩薩)은 와신상담(臥薪嘗膽)하고, 인욕하고, 참회(懺悔)한다.
기도할 때 가끔 눈물 코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려 샘을 만들고
내 설음, 네 설음을 토해내는 불자님들이 있다.
매몰(埋沒)되였든 환장(換腸)이 풀어지는 눈물이다.
*,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 세속인들은 어떻게 할까?
참고 견디다 안 되면 스스로 죽는다.
죽는 방법도 다양해 졌다.
옛날에는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목매다는 것이 다 이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발전? 했다.
비상, 청산가리, 농약을 거처 연탄, 면도날, 압박붕대 지하철 등 연구도 많이 했고 방법도 여럿이다. 자살률 세계1위 다들 자살도 잘한다.
보살(菩薩)이라면 어떻게 할까?
어차피 죽을 목숨 기도라도 하다죽자. 목매는 것도 죽는 방법이요,
동맥을 끊는 것도 죽는 방법이다. 기도하다 죽자.
죽을힘으로 기도하면 주검 중 최고의 주검, 열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아녹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하는 것이다.
“기도하다 죽어라” 혜암 큰스님의 섬뜩한 해탈법문이다.
보살이라면 죽을 정도로 괴로울 때 필히 잡고 매달려야할 화두이다.
세속 삶을 살아가는 재가 법사로서 나는 당황해야 할 때도 많다.
친목회 등의 모임에서는 별천지(別天地)의 삶을 경험한다.
주위의 시선을 무시하고 담배피고 술 마시고 고성으로 끄집어내는
세속 이야기와 도를 넘는 우어개소리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나도 옛날에 저질렀던 행위들인데도 엄청난 실망을 안겨준다.
부담과 엄청난 차별을 느낀다.
범부(凡夫)중생심(衆生心)은
탐(貪),진(嗔),치(癡) 삼독(三毒)심(心)으로 출발하고
보살심(菩薩心) 불자(佛子)들은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심(心)으로 출발한다.
진정한 불자(佛子)라면 보살(菩薩)심(心)발휘하여 범부중생을
구제(救濟)할 줄 알아야 된다.
수행(修行)을 통해 얻은바 지혜를 중생에게 회향(回向)하는 것이다.
기도를 권선(勸善)하고 법문을 보시(布施)하여 불제자(佛弟子)가
되게 하여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불자(佛子)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 갈수 있도록 개척(開拓)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보시(布施)법(法)이다.
불법(佛法)을 권선(勸善)하고 포교(布敎)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세세생생 쌓아온 고업(苦業)중생을 설득하기란 정말로 힘든 일이다.
얄팍한 지식으로 왜곡(歪曲)된 정보를 얻어 편협(偏狹)된 상식으로는
세속인의 지지보다는 배척(排斥)과 외면(外面) 받기 마련이다.
대한민국 전통사회는 품앗이 등을 통하여 상부상조해오면서
옆집 숟가락 개수도 알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잘았다.
그 집 형편을 주인보다도 이웃이 더 잘 알았다.
길쌈을 비롯한 일거리도 품앗이 해지만 말도 품앗이했다.
모여 안지면 서로 의논하고 걱정한다.
현대사회는 품이시는 고사하고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른다.
그런데도 말품앗이가 업(業)이 되어 못 고치고 지금이 더 심하다.
둘러 앉자다 하면 남의 이야기다.
남의 집 가정(家庭)사(事)부터 시작하여 끝도 없고 한도 없다.
그래서는 권선(勸善)과 포교는 안 된다.
불법(佛法)전수(傳授)는 진지(眞智)하고 엄숙(嚴肅)해야 한다.
부드럽고 언행(言行)으로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해야
초발심(初發心)하는 불자(佛子)가믿고 따름으로서 공덕이 생긴다.
이것이 올바른 애어(愛語)법(法)이다.
종교는 믿음이 생명이다. 간절한 믿음으로, 올리는 기도와 건성으로
발복(發福)만을 염두에든 기도는 다른 결과를 불려온다.
종교는 중생(衆生)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야한다.
불자(佛子)는 모름지기 중생들에게 이익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중생에게 이익을 주기위해서는 중생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야한다.
이것이 올바른 이행(利行)법(法)이다.
고통과 아픔을 알기위하여 중생 속에 파고들어 중생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중생과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불자(佛子)가 중생을 구제하기위하여 세속에 빠져들면 불자가 아니다.
파계(破戒)한 불자가 되는 것이다.
출가한 스님뿐 만아니라 재가(在家)불자도 파계(破戒)의 씻지 못할
무거운 업장(業障)이 따르는 것이다.
연꽃은 더러운 진 흙속에 있으면서도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물속에서도 피고, 물위에서도 핀다.
진 흙속에 뿌리를 내려 물속 더러움을 덮어 감추어주고,
물속을 깨끗이 정화(淨化)한다.
불자(佛子)는 연꽃 같은 삶을 살아가야한다.
이것이 올바른 동사섭(同事攝)법(法)이다.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섭(同事攝)을 불자(佛子)가
중생들에게 권선(勸善)하고 포교(布敎)하는 네 가지 방편이다. 하여
사섭법(四攝法)이라고 한다.
이 사섭법을 수행하려면 우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진정한 사랑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다.
미련(未練)없이 끝도 없이 무한정(無限定)베풀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필요로 한다. 자심(慈心)이다.
자심(慈心)은 중생과 아픔을 같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로 한다.
내 탓이요! 하는 마음이다. 힘들게 하는 배우자나, 자식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국민이나, 관리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안 만나고 더 조건 좋은 배우자를, 부모를, 일가친척을, 이웃을,
국민을 관리를 만났더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나 같은 못난 사람을 만나 저렇게 힘들어하는가. 하는 짠 하는 마음이 필요로 한 것이다.
이 짠 하는 마음이 바로 불, 보살의 마음이자 비심(悲心) 이다.
비심(悲心)의 출발은 중생의 즐거움을 같이 하는 마음이다.
남의 행복은 나의 고통이요, 나의 즐거움은 남의 고통에서 찾으려는 상대적 기준으로는 중생을 구제하지 못한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는
우리속담은 우리사회의 전통적 중생심이다.
앞에서는 상대의 좋을 일을 축하하고 돌아서면 나와 비교하는
마음은 중생심의 극치이다.
나와 남을 초월(超越)한 비교 없는 축하와 즐거움의 공덕을 수희(隨喜)공덕(功德)이라하고 희심(喜心)이라고 한다.
비교 없는 축하와 즐거움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나를 버려야 한다.
탐, 진, 치, 삼독 심을 앞세운 나라는 존재가 있는 한 올바른 불자가 될 수가 없다. 불자로서 올바른 권선과 포교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스님인데, 법사인데, 큰 화주보살인데, 수행을 많이 한 불자인데
하는 기득권을 가진 생각으로는 올바른 전법(傳法)을 할 수가 없다.
철저히 나를 버릴 줄 아는 불자(佛子)만이 진정한 전법(傳法)보살(菩薩)인 것이다. 불교 수행은 버리는 공부이다.
대표적 반야부 경전인 금강경에서는 수도 없이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의 사상(四相)을 버릴 것을 강조한다.
나라는 아상(我相)버리면 일체 사람들과 평등해 진다.
사람이라는 인상(人相)을 버리면 일체 중생들과 평등해 진다.
중생상(衆生相)을 버리면 유정(有情)무정(無情)을 가리지 않고
형상이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존재하는 일체 만법과 평등해 진다.
수자상(壽者相)마저 버리면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철저하게 나를 다 버리고 나면 성불한다.
나를 버릴 줄 아는 마음을 사심(捨心)이라고 한다.
자(慈),비(悲)희(喜)사(捨)심(心)을 사무량심(四無量心)이라고 하며
불자(佛子)가 중생구제에 필요한 덕목중의 덕목으로 강조된다
불자의 삶은 정제(淨濟)되고 안정된 지족(知足)의 삶이라면
세속의 삶은 거칠고 불안한 욕만의 삶이다.
누군가의 불심(佛心)으로 황량(荒凉)한 중생(衆生)들의 삶을 손질하고 가꾸어야한다. 세속 삶은 세속인이 잘 안다.
세속(世俗)에 뿌리내린 재가(在家)법사(法師)의 몫이다.
진흙속의 연꽃처럼 세속(世俗)에 물들지 않고 서서히 세속인(世俗人)을 정화(淨化)해 나아가는 것으로 서원(誓願)하고 살아간다.
허참! 이러면 연화(蓮花)법사가 되는 건 아닐까?
나는 웅봉 법사인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