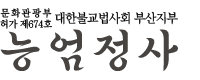한국불교의 발달과 민중(재가)불교의 역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능엄정사관련링크
본문
한국불교의 발달과 재가불교의 역활
1. 한국불교의 도입
공식 기록에 따르면 불교가 처음 한국으로 도입된 시기는 고구려 소수림왕(재위 371~384) 2년인 372년으로 알려져 있다. 전진(前秦:315~394)의 왕 부견(357~385)이 승려 순도(順道)를 고구려에 보내어 불상과 불경을 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북래설(北來說)이라고 한다. 또 다른 학설은 북래설(北來說)과는 달리 해로(海路)를 통하여 남해안으로 도입되었다는 학설도 있다. 이를 남래설(南來說)이라고 한다. 그러나 불교가 한국에 도입된 시기는 중국 양나라(梁502~557) 승려 혜교(慧皎497~554)가 저술한 양고승전(梁高僧傳 519) 등의 문헌에 의하면 그 이전에 이미 민간을 통하여 전해 내려왔다고 보는 학설이 나타나고 있다. 불교는 기원전 6세기에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을 거쳐 기원후 4세쯤 한국 민중에 전파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불교는 중국을 거치는 과정에서 붓다의 가르침인 근본불교의 순수한 교리보다는 중국문화가 가미된 격의불교(格義佛敎)로 변화하여 도입되었다. 한국 민중에 전파된 격의불교는 한국 민중의 전통 토속신앙이나 무속신앙을 배척하지 않고 수용하는 융합불교(融合佛敎)로 서서히 토대를 마련해나갔다. 불교가 민중불교로 도입되는 과정은 당시 민중(民衆)신앙 의 주류(主流)를 이루고 있던 토속(土俗)신앙과 무속신앙(巫俗信仰)을 수용하고 함께 용해(溶解)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처럼 민중불교로 전래(傳來)되는 과정은 남래설에게서도 확실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남래설은 정확한 연대는 전해오지 않는데 가야국 김수로왕의 황후 허황옥과 깊은 연관이 있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수로왕의 탄생 설화를 참고하면 ‘서기 42년 3월 9촌 촌장들의 구지봉에 올라 천신제(天神祭)를 올리니 하늘에서 6개의 알이 하늘에서 내려와 12일 만에 제일 처음 부화한 알에서 수로왕이 탄생했다’. 라는 전설과 함께 허황옥과 결혼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옛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은 16세에 가야국 수로왕과의 결혼하라는 부모님의 명을 받들어 천신(天神)의 안내로 서기 48년 20여 명의 수행원과 함께 해로(海路)를 통하여 인도에서 남해의 별로 나룻목에 도착했다.라고 삼국유사(三國遺事)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인도에서 성행하든 불교도 가지고 와서 전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20여 명의 수행원 중에는 허황옥의 오빠 허보옥도 함께 왔는데 허보옥은 허황옥의 결혼을 주선한 후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불모산(佛母山)에 들어가 수행에 전념하고 두문불출하였다는 설화(說話)도 있다. 또한 허보옥을 일러 길게 크게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여 장유화상(長遊和尙)이라고 명명(命名)하는 기록이 전해온다. 현재의 장유(김해시)라는 지명의 명칭도 이때부터 유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헌들은 김해수로 왕릉 납능정문(納陵正門) 쌍어문(雙魚紋)의 기록이나 문경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의 기록 등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 허황후(許皇后)가 인도의 아유타(月之國)에서 가져온 파사석(婆娑石)으로 원효가 세웠다고 전해오는 남해 보리암의 3층 석탑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보증하는 증거들은 넘칠 만큼 많다. 다만 우리나라 역사가 전승국(戰勝國) 중심으로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일연(三國遺事)과 김부식(三國史記)이 패전국(敗戰國) 가야사를 배제(排除)함으로써 역사의 뒤안길에서 남래설은 매몰되고 민중불교 전래설은 외면되고 사라지고 만 것이다. 한국불교의 민중불교 도입설은 규명되어야 한다. 남래설도 규명되어야 한다. 남래설이 규명되고 정설(正說)로 공인되기 위해서는 종교의 전래는 문화현상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교류사적(文化交流史的)인 입장에서 거론되어야 한다. 특히 불교 전래는 고대(古代) 동양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때 동양사적(東洋史的)인 측면에서 종합문화체(綜合文化體)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락국의 김수로왕과 허황후의 혼인을 인정하고 남래설을 부정하는 것은 불교 도입의 모순으로 난맥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한국불교의 역사를 바로세우기위해서는 민중 전래설 역사적 사실이 공인되어야 한다. 그 길은 한국의 재가불교가 정립되고 한국불교가 정상화가 되는 길이다.
2. 삼국에 불교 전래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서 석가모니에 의해 창시된 불교가 삼국시대에 중국을 거쳐 기원후 서기 372년 소수림왕(371~384) 2년 한반도에 전해졌다는 공식적 기록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초의 불교 전래는 중국이 아닌 인도에서 서기 48년(가락국 황후 허황옥)에 직접 전래 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불교는 특정 세력(승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민중 신앙으로 전래(傳來)되어 전통의 민속신앙인 토속신앙과 무속신앙과 용해되어 점차 세력을 넓혀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권력층 특히 왕실(王室)의 의도적 개입이 불교 전래에 구심점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집권 세력은 불교를 민심수습(民心收拾)과 민중융합(民衆融合)의 방편으로 사용했다. 실제로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인 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이용하면서 국력을 신장하고 국토를 확장하는가 하면 불교문화가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원동력이 되어 삼국을 발전시켰다. 삼국시대에서 불교를 수용한 것은 국가 발전과 새로운 문화 체제 확립에 큰 성과를 가져왔다. 삼국은 불교와 영욕(榮辱)을 같이 했다. 불교를 숭상정책(崇尙政策)을 펼친 군주(君主)와 국가는 국력 신장과 국토확장을 이룩하는 영광을 성취하는가 하면 불교를 등한시하는 군주와 국가는 국력이 쇠퇴해지고 종국(終局)에는 망국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삼국은 주로 4세기경에 불교를 수용한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불교를 통한 신진문화 수용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에서 불교를 제일 늦게 받아들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 배경에는 이차돈의 순교가 큰 계기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국은 시간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4세기경에 불교를 수용한다. 중앙집권체제 확립과 지방 토호 세력을 통합하려는 방편으로 불교를 수용하고 이용했다.
3. 고구려 불교(372~66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